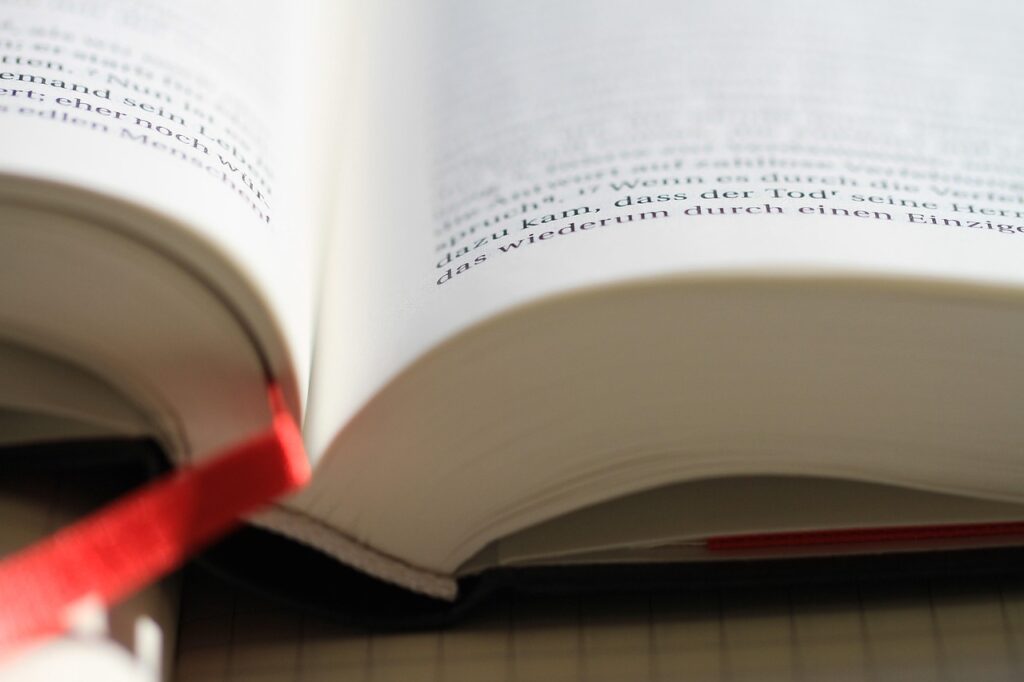사람은 바쁘게 살아간다. 멈추면 불안하고 쉬면 낙오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려 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은 움직임보다 숨에서 시작된다. 어떤 성취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졌던’ 기억이 살아 있다면 우리는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를 먼저 쉬게 하셨다. 그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존재의 순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신앙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 무엇을 이루느냐보다 누구와 머무르느냐가 신앙의 본질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체로 신앙을 행위로 판단한다. 봉사나 사역, 기도와 성경 읽기를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한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귀하고 복된 열매다. 그러나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 모든 행위는 생명의 뿌리를 놓친 것이다. 신앙의 시작은 일보다 숨이고, 말보다 머무름이며, 계획보다 동행이다.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안식을 주셨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는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정체성이 세워진다.
하지만 쉼은 무책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쉼의 공간에 사명을 더하셨고, 그 안식 속에 책임을 담으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받은 즉시 지켜야 할 삶의 자리와 해서는 안 될 명령이 함께 주어졌다. 모든 것을 주셨지만 단 하나는 금하셨다. 풍성함 안에 경계를 두신 이유는 인간이 자유 가운데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모든 것을 허락받았지만, 단 하나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을 때 자유는 욕망이 아니라 신뢰가 된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넘친다. 그러나 문제는 자유 자체보다 경계의 부재다. 경계가 없으면 방향이 무너지고, 방향이 사라지면 신앙은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신 사명은 풍요 속의 절제였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말씀을 기준 삼을 때에만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은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공동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라도 경계가 무너지면 방향을 잃고, 아무리 성숙한 신앙도 책임이 사라지면 무너진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 혼자는 고통이었고 완전하지 않았다.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하려면 서로 어디까지 다가설 수 있는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배워야 한다. 신앙의 동행은 경계 위에 세워진다. 그 경계는 멀어지게 하려는 선이 아니라, 함께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선이다.
공동체는 그 안전선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깊이 흔들린다. 섬김이 침해로 바뀌고 돌봄이 통제로 오해되며, 사랑이 부담과 의무로 느껴질 때 그곳은 더 이상 사명이 아니라 피로가 된다. 사람은 경계를 잃으면 타인을 사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조차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 전에 먼저 사람에게 쉼을 가르치셨다. 그리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다.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가꾸고, 그 안에 담긴 명령 하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다.
오늘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쉼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의미 있는 쉼을 잃었다는 데 있다. 잠시 멈추는 것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 삶이 왜 이렇게 고된지 알지 못한 채 쉬어도, 마음은 다시 무너진다. 하나님이 주신 쉼은 나를 누구라 부르시는지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 지어졌는지 돌아보는 자리이며, 방향을 회복하는 숨 고르기의 순간이다. 그 방향은 곧 책임이 되고, 그 책임은 삶의 경계를 만든다. 신앙은 그렇게 ‘머무름’ 안에서 방향을 얻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법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수록 사람은 일을 앞세우고 열심을 내세우며 자신을 증명하려 든다. 그러나 복음은 증명이 아니다.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선언하셨다. 그리고 그 선언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안식과 사명, 자유와 경계를 함께 맡기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방식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모든 관계는 여전히 숨에서 시작된다. 모든 신앙은 여전히 경계 안에서 자란다. 이 구조를 잃지 않는 사람만이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다. 쉼은 단절이 아니라 시작이며, 책임은 짐이 아니라 은혜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부르신 자리다.
매일말씀저널 | 말씀과 삶